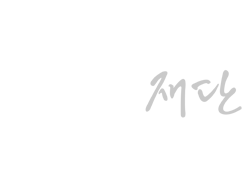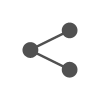시간이 약이라고 슬픔은 조금씩 엷어졌지만, 가끔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선생님, 시계추가 저쪽으로 가더니 안 오네요. 언제나 이쪽으로 다시 올까요?”라고 질문도 하고 싶다.
든든하게 기댈 수 있었던 스승은 떠나시고, 긴 겨울은 추웠다.
리영희 선생님을 그리는 단상 하나 (2012년 12월 6일, 최상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14:39
조회
2491
2012년 12월 6일 한양대학교 경영관 SKT홀에서 '故 리영희 선생님 2주기 추모 강연회'가 '우리 시대의 리영희 선생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양대 동문 모임 '청년동문회'의 최상명 회장의 추모사를 옮깁니다.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해였던 것 같다. 여름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을 찾았다. 구룡사를 지나 야영을 했다. 다음날, 혼자의 산행이라 야영 후 아침 일찍 정상도전에 나설 수 있었다. 사다리 병창을 오르기 전 세심정까지 4km 남짓 계곡 길을 걷게 되었다. 조금은 지루한 코스였다. 그 길에서 리영희 선생님을 만났다. 혼자 산행 중이셨다. 지팡이를 잡은 모습이 조금 낮설었다. 반갑게 인사를 했다. 87년 총학생회 간부였다고 인사를 드렸어도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셨다.
길은 한참을 이어졌기에 사제 간에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학생운동 시절 리영희 선생님 과목을 수강했다가 F학점을 받은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제법 시험을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F학점의 이유는 출석미달이었다. 87년은 1년 내내 민주화 투쟁으로 한 해를 보낸 해였다. 그해 나는 대한민국의 여느 청년들처럼 민주화운동에 나섰다. 그래서 사실 수업에 들어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민주화의 국민적 여망과 역사적 사명이 곧 시대정신이었기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학생운동 간부들에게 학점을 주시는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당시 민주화운동의 사상적 지도의 한 기둥이셨던 리영희 선생님으로부터 F학점을 받은 터여서 못내 아쉬웠었다.
내 볼멘 기억이 단초가 되어 시작된 이야기는 이내 이어진 선생님의 대답으로 급선회했다. '최군! 그래 요즘 자네가 이루려했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었다고 생각하나?' 순간 당황했다. 사실 밀레니엄 첫해, 나는 20세기의 고루한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닥칠 미래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성숙도면에서 아직 선진화되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선생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주의의 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은 아니라고? 당신 대답은 다 추상적이고 인지함정에 빠져있어. 87년 이후 민주화가 되었다고 믿고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 단계가 다음 성취 목표라고 스스로들을 강제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어. 그래서 IMF도 오고, 재벌과 언론이 헌법 위에 있는 데도 민주화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게지. 그게 다 기본 책무를 하지 않아서 오는 착각이야. 어쩌것어? 게으르면 고생하는 거지, 학점도 기본적 태도 때문에 F준거야. 서운해 말라". 몇 마디 말씀에 뒷머리를 맞은 듯한 혼란이 왔다.
민주주의의 문제로 얼마 전 책을 낸 적이 있다. 민주주의는 힘들다. 민주주의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풀어가는 문제다. 그런데 그 어떤 일상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고민하지 않는다. 문화가 제도로 되기까지는 무수한 민주주의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화 되었다고 믿고 다음 단계를 기대한다. 선생님 말씀대로 민주화 되었다는 인지함정(알고 있거나, 경험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믿는)에 빠져있다는 것은 훗날 재벌의 경제독점과 초헌법적 지위에서도, 불도저식 개발이 발전이라고 믿는 4대강 공사에서도,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워크푸어·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날 선생님과의 동행은 내 인생의 새로운 화두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민주주의, 기본, 인지함정으로부터 탈출하기는 내 학습의 도반(道伴)이 되었다. 선생님이 떠나신 지 2년이 지난 지금, 리영희 선생님 추모사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고형권 선배로부터 추모사를 부탁받자 나는 이내 원주 구룡사 계곡이 떠올랐다. 그리고 혹여 내가 그 때의 선생님 말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세상의 사표이시다.
전체 1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7 |
"나의 부인을 존경합니다"--김선주 칼럼니스트, 전 한겨레 논설주간
관리자
|
2021.02.25
|
추천 0
|
조회 3490
|
관리자 | 2021.02.25 | 0 | 3490 |
| 16 |
리영희 선생님을 그리는 단상 하나 (2012년 12월 6일, 최상명)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491
|
관리자 | 2021.02.23 | 0 | 2491 |
| 15 |
리영희 선생님은 사상의 은사입니다! (2012년 12월 6일, 한양대 동문 조용준)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671
|
관리자 | 2021.02.23 | 0 | 2671 |
| 14 |
선생님! 선생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 (2012년 12월 6일, 강경루 한양대 총학생회장)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906
|
관리자 | 2021.02.23 | 0 | 2906 |
| 13 |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윤관석 의원)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576
|
관리자 | 2021.02.23 | 0 | 2576 |
| 12 |
어두울수록 별은 맑게 빛나고 험할수록 길은 멀리 열려있다 (2012년 12월 6일, 이도흠 교수)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785
|
관리자 | 2021.02.23 | 0 | 2785 |
| 11 |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크게 보이는 분 (2012년 12월 6일, 정대철 교수)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462
|
관리자 | 2021.02.23 | 0 | 2462 |
| 10 |
어떤 서사(序辭) / 고 은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739
|
관리자 | 2021.02.23 | 0 | 2739 |
| 9 |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 이 시대의 리영희를 만나고 싶다 (2013년 7월 3일 윤창빈님 작성)
관리자
|
2021.02.23
|
추천 0
|
조회 3112
|
관리자 | 2021.02.23 | 0 | 3112 |
| 8 |
"존경하는 아내" / 정진경
관리자
|
2021.01.18
|
추천 0
|
조회 3340
|
관리자 | 2021.01.18 | 0 | 3340 |
| 7 |
그리운 리영희 선생님 / 정진경
관리자
|
2021.01.18
|
추천 0
|
조회 3167
|
관리자 | 2021.01.18 | 0 | 3167 |
| 6 |
그 뒷모습에서 리영희의 자존심을 느꼈다 / 김선주
관리자
|
2021.01.18
|
추천 0
|
조회 3466
|
관리자 | 2021.01.18 | 0 | 3466 |
| 5 |
故 리영희 선생께 (2016. 10. 9 김형건 님 작성)
재단 사무국
|
2018.10.11
|
추천 0
|
조회 2918
|
재단 사무국 | 2018.10.11 | 0 | 2918 |